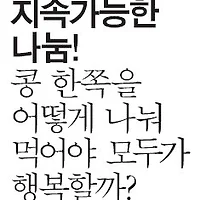봄, 봄, 봄, 봄,
대도시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도시에서만 주욱 살아온 나는 자연의 변화에 무척 둔감하고 무심한 편이었다. 그렇게 자연의 변화에 무관심했던 내가 변하기 시작했던 건, 6년 전 아기를 임신하고부터였다. 내 안에서 생명의 신비를 몸소 겪었던 연유였을까? 내 뱃속의 신비만큼이나 내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눈뜨기 시작했었다. 변화는 화초들에서부터 나타났는데, 그 전엔 내 손에만 들어오면 죄다 시들시들해져 일생을 마쳤던 식물들이 바로 그 똑같은 손끝에서 생명의 기운을 싱싱하게 내뿜기 시작했다. 자연에 내 눈과 귀를 열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나로선 퍽 놀라운 변화였다.
뱃속아기는 이제 6살이 되어 어느새 훌쩍(?) 컸지만 난 여전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명과 자연의 신비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곤 한다. 겨울 내내 탈색되어 숨죽이고 있다가 봄바람이 살랑거릴 즈음 언제 그랬냐는 듯 싱그러운 푸른 싹을 내는, 살아있는 자연. 볕이 따스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나무와 풀에서 올 봄의 기운과 향기를 느낀다. 봄기운에 살아나 숨쉬고 맘껏 꽃피우는 그네들만 보고 있어도 내 몸에선 생명의 기운이 감돈다. 그 신비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그 오묘한 변화에 가슴이 떨린다.
작년 봄, 봄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이 또 하나 있으니, 봄은 부드러움의 계절이란다. 어느 소식지에서 발견한 진주 같은 글귀이다. 어느 농부 아버지로부터 배운 봄에 관한 교훈이다.
“좋은 농부는 봄이 오면 논밭에 나가 얼어 있고 굳어 있는 땅을, 그리고 거칠고 딱딱한 흙을, 깊이 갈고잘게 부수어 아버지의 손바닥보다 더 부드럽게 해야 한다.
세상의 좋은 것은 모두 부드러움으로부터 출발하지. 갓난아이의 살결도, 논밭에 뿌린 새싹도, 갓지어낸 솜이불도, 뒤뚱뒤뚱거리며 엄마를 쫓는 병아리도... 그 부드러움에 씨를 뿌리면 씨앗은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촉촉함 속에서 싹이 돋고 자라 좋은 열매를 맺는단다.”
춥고 긴 겨울 끝자락에 아버지가 밭갈이 하시기 전 늘 주문처럼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났다.
(김은주 도서관지기단장,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소식지 2008년 3,4월호에서)
올 봄, 내 마음 속 단단해져 있는 마음의 흙을 깊이 갈고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굳어지고 거칠어지고 딱딱해진 흙들이 많으니깐. 따뜻한 봄볕 아래서 단단해지고 거칠어져 있는 마음을 녹이고 싶다. 그래야 보드랍고 따스하고 촉촉해진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 있단다.
마음의 흙을 갈고 싶다, 부드럽게.
글쓴이: 꽃별 미래교육팀 간사

'기윤실, 소박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0) | 2009.05.10 |
|---|---|
| (창의상상) 제1화. 윤실이 탄생비화!^^ (4) | 2009.04.10 |
| (지속가능한 나눔) 콩 한쪽을 어떻게 나눠 먹어야 모두가 행복할까? (0) | 2009.03.19 |
| 의미있는 이름을 불러 주세요! (0) | 2009.03.16 |
| '평범함 속의 특별함' 박상규회원을 소개합니다! (0) | 2009.03.04 |